선물은 재산의 양도이자 명에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도 선물을 바란다.
선물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 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므로 이를 두 부류의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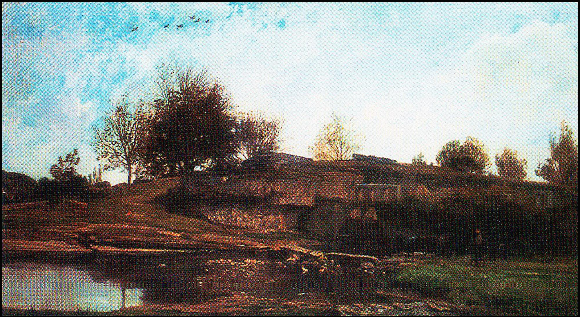
칠팔십년대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그 당시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가면 ‘급행료’, ‘담뱃값’이라는 비공식이지만, 마치 공식화처럼 되던 때였다. 지금 생각을 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정말 서럽고 서러운 시절이었다. 업무를 보려고 온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살짝 ‘급행료’, ‘담뱃 ’을 찔러주면, 먼저 온 사람보다 먼저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 안 되는 일도 되게 처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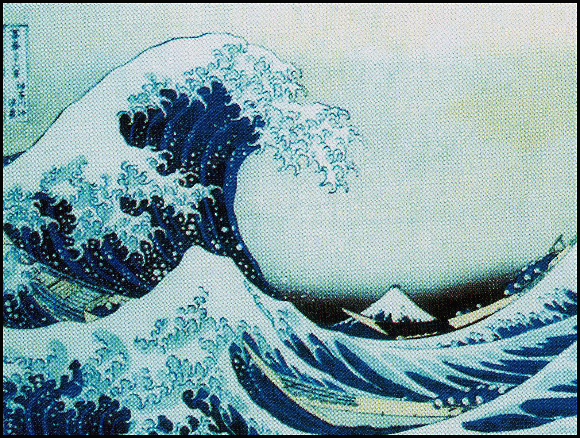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학생의 면면(面面)을 파악하기 위해 담임선생은 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을 하였다. 그 취지야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느 부모님 슬하에서 정서적인 생활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각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생님에게 봉투에 돈을 두둑이 넣어 주었다. 일명 ‘촌지(寸志)’라 하였는데, 형편이 넉넉한 부자들이야, 촌지를 챙기는 것이 별문제가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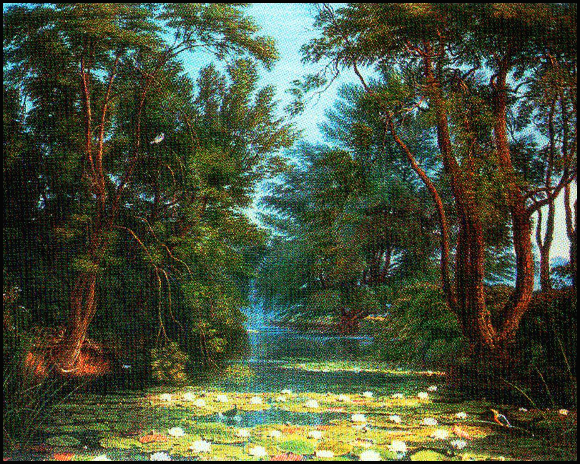
먹고사는 기본욕구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대다수 가정에서는 촌지는커녕 간단한 다과조차 대접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 그 시절의 사회현상이었다. 점심 도시락조차 싸가지 못해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던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교사라는 천직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이 다수였다면, 일부 교사들은 촌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당연하다는 듯했던 것이 그 시절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다 보니 ‘김영남 법’의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얼마 전 가짜 수산업자라는 사람에게 정관계 인사들이 이런저런 뇌물을 받아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하던 분도 이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찬사와 칭송을 받았던 분이라 참으로 충격이었다. 한편, 풍자메뉴도 생겼다지,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고,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의 뜻을 모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인가 과분한 것을 갖고 와 준다면 한 번쯤 공짜는 없다는 말을 상기해 본다면,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수는 있으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더위를 피해 간다는 피서라도 가고 싶지만, 나이가 나이인 지라 코로나19로 어디 가기도 쉽지 않아, 책을 읽으며 피서를 하는 촌부가 책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글귀에 적어 본다.
'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상들 (0) | 2021.08.21 |
|---|---|
| 다양한 독서가 필요한 그대에게 (0) | 2021.08.04 |
| 정치를 하려는 그대에게-Ⅱ (0) | 2021.07.21 |
| 오버랩되는 한 사람 (0) | 2021.06.07 |
| 멀리 내다 볼 수는 없나. (0) | 2021.06.04 |